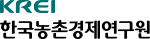

|
‘지방소멸론’ 유감
새글 40
|
||||
|---|---|---|---|---|
| 기고자 | 김정섭 | |||
넉 달 전 ‘학교와 어린이집, 농촌 소멸을 막을 최소한의 조치’라는 제목으로 기고했다. 제목에 쓴 ‘농촌 소멸’이라는 말을 철회하고 싶지만 이미 늦었다. 독자들께 사과하고 내 언어 감각의 둔감함을 자백하면서 글을 시작한다. 무심결에 가져다 썼는데,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인가? 소멸(消滅), 사라져 없어진다는 뜻이다. 한국언론재단이 운영하는 뉴스 데이터베이스 ‘빅카인즈’에서 ‘지방소멸’과 관련된 신문 및 방송 뉴스 건수를 검색해보았다. 언론보도에 ‘지방소멸’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 건 2015년이다. 약 32건이 집계됐다. 2020년에는 2711건이었던 게 불과 2년 뒤인 2022년에 1만건을 넘더니, 2024년 10월 현재 1만7566건이라고 집계됐다. ‘지방소멸’이라는 심각한 말이 일상적으로 쓰인다. 한국고용정보원이라는 공공기관에서는 시군구 기초 지방자치단체 각각의 소멸위험지수를 해마다 발표한다. 이제 8년쯤 됐다. 그 지역의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값을 ‘소멸위험지수’라면서 발표한다. 그 값이 0.5 미만인 지역을 ‘소멸위험지역’이라고 이름 붙였다. 가임 연령대의 여성 인구가 고령자의 절반이 안 되는 지역을 말한다. 인구이동 등의 다른 변수가 작용하지 않으면, 약 30년 뒤에는 그 지역이 없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소멸위험지역이라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으면 위험하다고 평가하는 연구자들이 있다. 나도 그렇다. 그런데 매년 이 지수가 발표되면 소멸위험지역이라고 분류된 지방자치단체들은, 대부분 농촌인데, ‘인구 대책 태스크포스’를 만든다느니, 출산장려금을 대폭 늘려 지원한다느니, 귀농·귀촌 인구 유입에 힘을 쓰겠다느니, 요란하다. 천재지변이라도 닥친 듯하다. 공포 마케팅이 따로 없다. 소멸위험지수는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지만, ‘소멸위험’이라는 단어가 풍기는 선정적인 말맛과 정책 측면의 파장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농촌 지방자치단체들이 인구 위기를 자각하도록 자극했다는 게 지방소멸론이 거둔 성과라면 성과라 할 수 있는데, 딱 거기까지다. 오히려 큰 걱정거리가 될 수 있다. 두 가지만 짚어본다. 첫째, 지방소멸론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조잡한 논리와 결합해 국가 중요 정책을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다. ‘소멸이 예정된 곳에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니, 현재 인구가 많은 중대 규모 도시에 자원을 집중 투입하자’는 부당한 선택의 알리바이로 활용될 수 있다. 소멸위험지수는 일본의 마스다 히로야가 쓴 ‘지방소멸’이라는 책에 등장하는 지방소멸지수를 차용한 것이다. 마스다는 농촌 지역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정책에서 배제하려는 근거로 지방소멸지수를 만든 것이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저명한 학자들이 지방소멸론을 비판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비판이 거의 없다. 오히려 ‘지방도시 살생부’라는 자못 험악한 제목의 책이 출간돼 제법 팔렸다고 한다. ‘농촌’은 그 살생부에 이름조차 올리지 못했다. 이미 죽었다고 생각해서 살생부에서 뺀 것일까? 둘째, 특정 지역에 ‘소멸위험지역’이라는 꼬리표를 붙임으로써 안 좋은 선입견을 조장하고 피해를 줄 수 있다. 소멸위험지수는 지역마다 차이가 나는 합계출산율을 고려하지 않는다. 합계출산율이 전국 상위에 드는 곳은 대부분 현재 인구가 적고 고령화된 농촌이다. 30년쯤 후에는 바닥을 치고 인구가 증가하거나 다른 지역에 비해 인구 전망이 낙관적일 가능성이 큰데, 소멸위험지역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은 부당하다. 그리고 이 지수는 지역의 장래 인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인구이동도 반영하지 않았다. 그것을 가지고 ‘30년 뒤에는 인구가 아예 사라질 운명에 처한 곳’이라고 과장된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낙인찍는 것이다. 낙인은 어떤 대상에게 반복적인 방식으로 부정적 이미지를 형성한다. 소멸할 지역에 어린 자녀를 데리고 이주할 젊은 부모는 별로 없다. 그런 지역에서 상업적 비즈니스를 시작할 사람도 별로 없다. 어느 공공기관이 오랫동안 매출을 올리지 못한 음식점들을 골라서 ‘폐업할 위험이 있는 가게’라고 표지판을 붙여 준다면, 그건 장사를 잘하라는 뜻인가 망하라는 뜻인가? 농촌이 곤경에 처한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호들갑스럽게 떠든다고 경천동지(驚天動地)의 비책이 튀어나올 리 없다. 농촌의 인구학적 위기는, 비유하자면, 적어도 30년 이상 진행된 난치성 만성질환에 가깝다. 그렇지만 치명적인 질병은 아니다. 이런 종류의 병고에 오랫동안 시달린 사람들이 더러 깨닫는 지혜가 있다. 첫째는 생활환경과 습관을 바꿔 통증이나 신체 활동의 제약에 적응하면서 삶의 질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것이다. 인구가 줄어 어려움은 당연히 크지만, 적은 인구로도 주민 생활에 꼭 필요한 것은 반드시 확보하는 혁신적인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둘째는 별무소용(別無所用)인 종래의 약과 외양만 다를 뿐 성분이 같은 약을 구입한다며 돈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다. 정책에는 돈이 든다. 타성에 매몰된 재정 집행이나 정책사업 기획의 악습을 버려야 한다. 셋째는 고통에 굴복해 절망한 나머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죽지 않을 병인데도 공연히 죽는 일이 없게 하는 것이다. 희망은 냉철한 이성에서 나오기도 한다. |
||||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