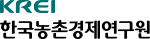

○ 2013~2017년 『농가경제조사』 표본 농가를 4개 유형(청장년 소농, 청장년 중대농, 고령 소농, 고령 중대농)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 중대농·소농 집단 농업소득 격차가 확대되면서 농가소득 격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 청장년 집단은 고령 집단보다 농외소득을 많이 얻고 있고, 고령 집단은 이전소득에 상대적으로 많이 의존하고 있다.
○ 농가 유형별로 소득 원천과 격차 변화 양태가 달랐다.
– 청장년 소농은 영농 활동보다 농외 활동이 주요 소득원이다. 분석 기간 동안 집단 내 농외...
○ 2013~2017년 『농가경제조사』 표본 농가를 4개 유형(청장년 소농, 청장년 중대농, 고령 소농, 고령 중대농)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 중대농·소농 집단 농업소득 격차가 확대되면서 농가소득 격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 청장년 집단은 고령 집단보다 농외소득을 많이 얻고 있고, 고령 집단은 이전소득에 상대적으로 많이 의존하고 있다.
○ 농가 유형별로 소득 원천과 격차 변화 양태가 달랐다.
– 청장년 소농은 영농 활동보다 농외 활동이 주요 소득원이다. 분석 기간 동안 집단 내 농외소득 격차가 커지고 있다.
– 청장년 중대농은 영농 활동을 중심으로 농외 활동에도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평균 소득이 가장 많지만 소득 불안정성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
– 고령 소농은 농업·농외소득 창출 기회가 모두 제한적이었다.
– 고령 대농은 영농 활동에서 주로 소득을 얻지만, 집단 내 농업소득 격차가 커지고 있다.
○ 2013~2017년 ‘상대적 빈곤률’ 비중은 11.2~13.8%였고,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소농 집단에서 비중이 더 높았다.
○ 2013~2017년 도·농 소득 격차는 점차 좁혀져 2017년에는 64.1%였다. 2013~2016년 농가 처분가능소득은 도시 근로자 가구의 평균 65.1%였다.
○ 농가가 점차 다양하게 분화되어 왔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책 대상(target)을 세밀하게 설정하고 적절하게 대응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 청장년 소농 집단은 농업소득 비중이 낮은 원인(예를 들어 농지 확보나 영농 기술 습득 제약)을 파악하고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 청장년 중대농 집단에게는 규모 확대 및 소득불안정 완화 관련 정책이 보다 중요하다.
– 고령 소농 집단은 농가 수가 가장 많으면서 소득과 삶의 질 측면에서 가장 취약하다. 농업 정책에 더해 복지 또는 지역 정책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 고령 중대농 집단은 일정 기간 영농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경영안정 정책 대상에 포함시키되, 중장기적으로는 청장년 집단이 농지를 양도·임대 형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KREI의 출판물은 판매 대행사 (정부간행물판매센터)와 아래 서점에서 구입 하실 수 있습니다.
| 교보문고 | http://www.kyobobook.co.kr/ |
|---|---|
| 영풍문고 | http://www.ypbooks.co.kr/ |
| 알라딘 | http://www.aladin.co.kr/ |
| 상세정보 조회 | 좋아요 | 다운로드 | 스크랩 | SNS공유 |
|---|---|---|---|---|
| 121935 | 7 | 1323 | 1 |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