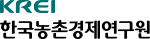| 한국농어민신문 기고 | 2017년 2월 3일 | 김 정 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주식회사의 소유자, 주주가 신경 쓰는 건 이윤이다. 기업 경영에서 얻은 총 수입에서 임금, 이자, 지대, 감가상각비 등의 비용을 빼고 남는 몫을 이윤이라 한다. 이윤이 많을수록 주주에게 돌아갈 몫(배당)도 많다. 주가도 올라갈 테다. 이윤은 기업의 목적이다. 이윤이 안 남는 사업은 접어야 한다. 일시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면 말이다. 기업이 농장을 경영했는데 이윤이 없다면 농지를 처분하거나 농지 위에 다른 설비를 놓아야 한다. 농산물이 아니라 이윤을 남길 수 있는 다른 상품을 생산해야 하리라.
한국에서는 대부분 농가가 농장을 보유한다. 농가가 농장을 경영할 때, 특히 농업 노동의 대부분을 가족이 감당할 때, 그런 농업 경영 형태를 가족농이라고 부른다. 농가 구성원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건 살림살이다. 영농활동에서 얻는 농업 총수입에서 이자, 지대, 감가상각비, 가족 외부에서 충당한 일용 농업 노동자 임금 등의 비용을 빼고 남는 몫이 농업 소득이다. 이 농업 소득에서 (실제 화폐로 지불되는 것은 아니므로 가상적이기는 하지만) 농가 구성원의 노동을 임금으로 환산한 ‘자가노력비’를 제외한 나머지가 이윤에 해당한다. 가족농은 이윤이 영(0)이어도 농업 소득이 있으면 농사를 계속 짓는다. 가족농에는 원래부터 주주가 없다. 심지어 농업 소득이 아주 적은 경우에도 자가 영농활동 외에 다른 경제활동, 가령 겸업을 하거나 농가 밖에서 임금 노동을 하며 소득을 얻어 살림살이를 유지한다. 그리고 살림살이를 계속할 수 있으면 농사도 계속된다.
기업농은 이윤, 가족농은 소득 추구
기업농은 이윤을 추구하는데 가족농은 소득을 추구한다. 기업농은 주주가 가져갈 몫이 없으면 농사를 그만둔다. 북아프리카에는 기업이 농업에 뛰어들었다가 세계 농산물 시장에서 가격이 하락하여 수익성이 떨어지자 철수하는 바람에 버려지고 황폐해진 땅이 많다고 한다. 기업농에 고용되었던 농업 노동자들은 졸지에 실업자가 되었다고 한다. 사실상 극빈층이 되었다는 뜻이다.
기업농과 가족농, 농업의 지속가능성에 어느 쪽이 더 많이 기여할까? 혹은 농촌 지역사회의 회복력(resilience)에 어느 쪽이 더 크게 기여할까? 기업농은 사악한 존재라는 식의 거칠고 투박한 주장을 하려는 게 아니다. 물류, 마케팅, 과학기술을 접목한 신상품 개발 능력 등에서 대기업은 우월하다. 기업이 그런 잠재력을 농업 부문에서 실현하겠다고 나설 때, 그 의지를 원천적으로 꺾을 명분이 마땅치 않다. 즉, 아주 넓은 의미에서 기업의 농업 참여를 반대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기업의 농지 소유를 전면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농민이 농지를 소유해야하는 이유
농사짓는 농민이 농지를 소유하고 이용한다는 것, 이는 아주 오래된 꿈이다. 오래된 만큼이나 단단한 어떤 진실을 품고 있다. 수백 년 전에 제출된 유형원의 균전론(均田論이)이든, 이익의 한전론(限田論)이든, 정약용의 여전론(閭田論)이든 구체적인 방편에서 차이가 있을 뿐, 농지(자본) 분배 상황을 혁파해야 한다는 밑바탕의 뜻은 같다. 왜 그랬는가? 지주가 작인(作人)으로부터 수취하는 지대, 즉 자본소득(이라 쓰고 불로소득이라 읽는다)이 저절로 축적되게 허용하는 당대의 제도가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의 생활을 쥐어짜는 현실을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이야말로 핵심 고리라는 것을 간파했기 때문이다.
토마 피케티(T. Piketty)가 입증한 상식, ‘자본소득이 노동소득보다 빠른 기울기로 증가할수록 부(富)와 불평등은 더욱 심화된다’는 명제는 한국 농업에도 고스란히 들어맞는다. 농사지어서 농지(자본)를 축적할 수 있는가? 2015년 기준으로10a(300평)당 논벼 소득은 약 56만원이다. 대표적인 밭작물 마늘, 양파, 고추의 10a당 소득은 각각 355만원, 212만원, 222만원이다. 고추의 경우, 40대 연령의 젊은 부부 두 사람이 정말로 부지런히 손발을 놀려 일할 때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면적의 상한이 50a(1500평) 정도다. 내외가 힘들게 반 년 고추 농사지어야 1000만원 남짓 벌 수 있다. 사실 그 정도면 상당히 괜찮은 수준이다.
이 같은 노동소득 여건에서 대다수 농가는 열심히 농사지어 저축하고 그것으로 땅을 늘리겠다는 꿈을 꿀 수 없다. 돈 있으면 은행에 예치해서 이자를 받는 게 농지를 사서 직접 농사짓는 것보다 더 많은 소득을 얻는 길이 될 수도 있다. ‘돈이 돈을 버는 속도가 일해서 돈을 버는 속도보다 빨라서 소득 올라가는 속도보다 더 빨리 자본이 축적되고 불평등이 심화된다’는 해설은 한국 농촌에도 들어맞는다.
가족농의 삶, 끈질긴 생명력의 징표
땅을 많이 갖고 있으면 저절로 땅이 늘어나지만 적은 땅에서 죽어라고 일해 봐야 땅 늘리는 것은 고사하고 살림살이를 유지하기도 어렵다. 돈(땅)이 돈(땅)을 벌지, 농업 노동이 돈(땅)을 벌지 못한다. 그런데 다수의 농민은 자본소득이 아니라 노동소득을 목표로 일한다. 일해서 얻는 소득으로 살아가는 농민의 꿈은, 살림살이를 그럭저럭 유지하고 여력이 있으면 농지도 늘려가는 데에 있다. 기업의 농지 소유 전면적 허용 또는 헌법의 경자유전(耕者有田) 조항 삭제 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농민의 오래된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조건을 찾자는 게 아니라, 꿈은 이루어지지 않을 테니 포기하고 땅을 넘기라고 신호를 보내는 건 아닌가?
농업 소득이 불충분한 현실에서, ‘농사짓고 살려고 가족 가운데 누군가는 농사가 아닌 다른 일을 하는’ 일은 한국 농촌에서 흔하다. ‘촌에서 투잡, 쓰리잡 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어요’라는 말은 농업·농촌의 힘겨운 현실을 드러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농민의 삶에서 우러나는 끈질긴 생명력을 보여주는 징표다. 힘든 상황에서도 살림살이를 계속해야 하므로 계속 농사를 짓는 가족농이 농촌을 지키고 있다. 이야말로 천만다행 아닌가? 다만, 이 ‘천만다행’이 얼마나 오래갈지 걱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