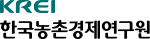

|
학교와 어린이집, 농촌 소멸 막을 최소한의 조치
새글 48
|
||||
|---|---|---|---|---|
| 기고자 | 김정섭 | |||
농촌이 저밀도화하는 것과 소멸하는 것은 다르다. 저밀도 상황이라면 그 와중에도 사람들이 나름의 일상과 장소를 유지해 나갈 수 있다. 그런데 소멸한다면, ‘소멸’이라는 말이 의미하듯 농촌 사회의 유지·재생산은 불가능해진다. 저밀도는 견딜 수 있지만, 소멸은 견딜 주체가 없음을 뜻한다. 젊은 인구를 최대한 보존하는 게 농촌이나 한국 사회 전체를 위한 방책일 것이다. 여성 1인이 평생 낳을 수 있는 자녀 수를 따져 발표하는 합계출산율이 2명 이상이 돼야 현재의 인구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서울시의 합계출산율이 0.8명 아래로 떨어진 지 여러 해가 지났다. 한편, 농촌 지역의 합계출산율은 대도시보다 높다. 전국 상위권에 드는 지역 몇 곳은 2~2.5명 수준인데, 거의 모두 농촌 시군이다. 평균으로 보면 농촌이 도시보다 소득이 낮은데 오히려 합계출산율은 더 높다. 출산에 돈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이유는 불분명하지만, 인구밀도가 낮은 곳에서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렇다면 정부의 저출생·고령화 대응에서 진지하게 검토할 것은 인구의 도시 집중을 억제하고 농촌으로 분산하도록 유도하는 정책 아닐까? 물론, 귀농·귀촌 정책 등 그런 방향의 정책을 꽤 오랫동안 추진해왔다. 그래도 흡족하지 않은 것은, 젊은 사람들이 농촌에서 살기를 주저하게 만드는 걸림돌을 제거하는 데 그동안의 정책이 무관심하거나 무능했기 때문 아닐까? 초등학교와 어린이집 문제가 대표적인 걸림돌이다. 이 걸림돌을 치우는 것이 ‘농촌 소멸을 막을 최소한의 조치’일 테다. 맞벌이는 도시에만 있는 현상이 아니다. 농촌도 마찬가지다. 낮에 아이를 맡길 보육시설이 없다면, 부모 중 한 명은 경제활동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어린이집이 있더라도 자신이 사는 읍면이 아니라 이웃 읍면에 있는 것이라면, 매우 곤란해진다. 농촌 면 지역의 평균 면적은 약 60㎢, 서울시 관악구 면적의 두 배쯤 된다. 이 넓은 곳에 어린이집이 하나도 없어 옆의 다른 읍이나 면에 있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까지 0~6세 자녀를 날마다 부모가 등하원시키는 일은 감내하기 어렵다.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폐원하면 그것은 가까운 장래에 지역의 초등학교도 폐교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하여 지역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겠냐는 불안감이 고조된다. 2022년 말 기준 전국 1405개 읍면 중 어린이집이 하나도 없는 곳이 511개로 그 비율이 36.4%다. 시골 환경이 자녀를 키우는 데 좋은 조건이라 여겨 귀농·귀촌했다는 이들은 적지 않다. 그런데 보육 여건 악화를 경험하면서 농촌에 계속 살아도 되는가를 고민하게 된다. 학교, 그중에서도 특히 초등학교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2023년 기준으로 도시 지역 초등학교의 학생 수는 평균 580.3명이다. 농촌 학교, 특히 면 지역 학교의 경우는 85.5명에 불과하다. 세밀하게 보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농촌 면 지역 초등학교의 71.1%가 전교생 60명 미만의 ‘작은 학교’다. 20명도 되지 않는 ‘아주 아주 작아 폐교 위기에 몰린 학교’의 비율이 19.9%다. 학생 수가 적으면 학교 운영의 비용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만 문제가 아니다. 여러 측면에서 학교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또래 집단 내 교우관계, 통학, 학교 수업의 질, 학교에서 진행하는 방과 후 수업의 운영과 학생의 선택권, 상급 학교 진학 문제, 방과 후 돌봄, 학교 급식 등 관련되지 않는 것이 없다. 학교가 아예 없어지는 것, 폐교야말로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다. 2010년 이후 전국 431개의 초등학교가 폐교했는데, 그중 85.6%가 농촌 학교였다. 위기 속에서도 그동안 지방 교육당국과 농촌 주민들이 노력해 ‘작은 학교’들이 간신히 버텨왔다. 전국의 1400여 농촌 읍면 중 현재 초등학교가 하나도 없는 곳은 11곳에 불과하다. 하지만, 백척간두에 놓인 상황이다. 폐교는 농촌의 젊은 층 주민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농촌에 사는 젊은 층이 자녀 교육 문제 때문에 타지로 이사 갈 것을 고민하게 만들고, 도시에 사는 젊은 층이 농촌에서 살 의향을 처음부터 꺾어 놓는다. 무엇보다 젊은 인구가 농촌 지역으로 새로 유입될 가능성을 원천 봉쇄한다. 인구 과소화가 심각한 농촌 면 지역은 일종의 악순환 구조에 빠져 있다. 영유아 보육 및 초등학교 교육 여건의 악화가 악순환 구조를 구성하는 중요 요소 중 하나다. 그것은 유소년 인구와 30~40대 인구의 전입을 차단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농촌 지역사회에서 인구 재생산의 단서를 아예 삭제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 수가 적은 학교를 유지하는 데 따르는 재정 부담을 걱정하는 논리’와 ‘재정 효율이 떨어지더라도 장기적으로 농촌, 아니 더 나아가서는 한국 사회 전체의 인구학적 재생산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논리’가 첨예하게 맞설 때가 가까워졌다. 어떻게 해야 할까? |
||||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