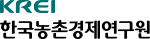|
농경나눔터 농정포커스 | 2011년 9월호 |
서종혁 ![]() (한경대학교 연구교수) (한경대학교 연구교수) |
최근 국제유기농업연맹(IFOAM)과 EU유기농업연구소(FiBL)가 공동으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유기농업을 지속적인 성장 잠재력을 갖는 미래의 녹색산업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유기농산물이 2007년 이후 세계적 금융위기에 따른 불황기에도 지속적인 판매 신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한다.
국제 유기농산물의 시장 규모는 2009년 기준 약 550억 달러(약 63조 원)이며 2006년에 비하여 약 37%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율은 과거 2000년대 전반기의 연간 증가율 30%에는 못 미치나 불황기에도 소비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한다면 관행농업을 대체하는 성장농업이라고 평가해도 큰 무리가 없다. 특히 유럽연합(EU) 시장은 다른 지역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발전하고 있어 주목 받고 있다.
수요 늘며 시장 규모 커지는 중
유기농산물의 경작 면적 증가는 시장 규모의 증가에 비하여 다소 낮은 수치를 보인다. 세계 유기농 경작지는 1999년의 1,100만 ha에서 2009년에는 3~4배 증가한 약 3,700만 ha이며 이는 2006년 대비 23.6% 증가한 면적으로 동 기간 중 시장규모 증가율 37%와 차이가 있다. 이는 유기농산물이 부가가치가 높은 다양한 가공상품으로 변화되면서 시장거래 규모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유기농업은 아직도 유치산업 단계로 전체 농산물 생산면적의 1%를 겨우 넘어서고 있다. 유기농산물의 전 단계인 무농약 농산물을 합하면 총면적이 11만 ha(2010년 기준)에 달해 이는 전체 농경지의 약 6%를 점하는 수치로 10년 전에 비해 크게 증가되었다. 앞으로 과거와 같은 추세로 발전하면 우리나라도 가까운 시일 내에 세계적인 유기농업국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적으로 유기산업이 빠른 속도로 성장한 데는 시장적 요인과 제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시장적 요인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건강과 웰빙 중시의 소비자 트렌드를 꼽을 수 있다. 산업화의 진전에 따른 생태환경의 파괴와 식품의 안전성이 위협 받으며 소비자는 관행농업보다 환경친화적인 유기농업에 높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인구는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이런 현상은 선진국시장에서 먼저 나타나고 있다. 안전성이 보장된 친환경적 상품이 일반상품에 비해 소비의 소득탄력성이 높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국제 유기상품시장은 전통적인 농산물과 식품에서 탈피하여 수산물, 임산물, 야생채집물(약초류, 버섯류, 벌꿀 등), 화장품과 섬유 같은 비식품 분야까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유기섬유나 화장품은 최근 연간 50%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며 급속한 발전을 보이고 있다. 국제 간 교역이 크게 이루어지는 상품은 바나나, 커피, 차, 코코아 등 열대산 농산물과 선진국에서 주로 생산하는 농축산 가공품과 주류를 꼽을 수 있다.
국가별 다양한 지원정책들
유기산업의 빠른 성장을 가능케 한 제도적 요인으로는 정부의 지원정책을 들 수 있다. 정부의 다양한 정책으로 유기산업이 최근 20년 사이에 틈새시장에서 주력시장으로 발전하고 있는 지역은 서유럽 국가들이다. 여기서 영국은 예외이다. 최근까지도 영국은 농업 생산 방식과 식품의 선택에 자유방임주의를 채택하여 유기산업의 선두그룹에 끼지 못하였고, 한발 더 나아가서 녹색경제 분야에서도 다른 국가들에게 뒤쳐지고 있다. 세계 유기농시장을 선도하는 미국도 최근까지는 유기농산업의 발전을 시장에 맡기는 최소의 산업정책을 채택하고, 시장질서 유지에 필요한 인증과 라벨링 제도의 확립에 주력해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기상품에 대한 국내외 수요 확대와 유기농산업이 갖는 비교역적 기능을 고려해 생산농가에 대한 직불제 도입 등 적극적인 정부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
서유럽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유기산업 지원정책은 국가마다 다양하다. 회원국 전체에 적용되는 EU 정책으로는 2004년 유럽위원회가 채택한 ‘유기농과 식품에 관한 EU 행동계획’이다. 여기서 위원회는 유기농업이 환경보전, 동물복지, 농촌개발에서 갖는 잠재적인 이익과 가치가 분명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동 계획 6조는 “회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개발계획에 반드시 유기농업과 산업을 포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른 회원국의 몇 가지 정책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유기농 면적비율이 매우 큰 오스트리아는 지역개발 예산의 68%를 친환경/유기 방식의 농업육성에 투입하고 있다. 덴마크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유기농업을 성장잠재력이 큰 녹색성장산업으로 보고 유기농 면적 확대, 기술 개발 및 시장 개척분야를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해오고 있다. 네덜란드도 유기농 발전 잠재력을 일찍 인식하고 재배면적 확대, 관행농과 유기농을 연계한 기술 개발 및 정부 구매에서 친환경·유기상품을 우선하는 녹색 구매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 스웨덴은 유기농학교급식의 확대, 현장중심의 유기농기술 개발과 확산에 대한 보조, 유기농 식생활 교육 지원 및 유기농 전환 지원 등 매우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유기산업은 과거 틈새시장에서 이제는 주류시장의 성장산업으로 그 위치를 바꾸고 있다. 이미 서유럽 국가에서 녹색성장 산업육성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유기농업 지원정책과 그 성과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나아가 올해 9월 25일~10월 5일 중에 아시아 최초로 개최되는 세계유기농대회도 세계 78개국의 다양한 유기상품과 기술, 선진정책을 익히는 좋은 기회다. 이를 잘 활용하여 앞으로 우리나라 유기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도약하기를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