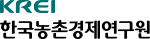|
KREI 논단| 2011년 4월 4일 |
김 정 호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정책적 이슈에 대한 연구자의 의견이 언론에 보도될 때면 동료 연구자로서 간혹 당혹스러운 경우가 있다. 그것이 연구원의 견해냐고 외부에서 질문을 받을 때이다. 이에 대해 “연구보고서 내용이라도 연구원의 공식 견해인지 불분명한데, 인터뷰 정도는 당연히 개인적 견해이죠”라고 답변하면서도 왠지 떨떠름하다.
혹자는 전문가로서 주장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무엇이든지 소신대로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너무 순수한 발상이다. 좋은 주장이라도 편견이나 독설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적어도 사회적 반향이 큰 이슈에 대해서는 자기 생각을 정리하는 차원에서도 동료나 선배 연구자의 의견을 들어봐도 좋지 않을까?
KREI는 농정 분야에서 이 시대 최고의 지성이 모인 전문가 집단인데, 최근 들어 ‘집단지성’이 취약해지는 것 같다는 의구심이 든다. 집단지성(集團知性, :collective intelligence)이란 다수의 개체들이 서로 협력 혹은 경쟁을 통하여 얻게 되는 집단적인 지적 능력을 말한다. 전문가 집단일수록 다양한 의견 수렴이 용이하여 집단지성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휘되지만, 때로는 일부 그룹의 독선에 따른 부정적인 측면도 존재한다.
집단지성이 취약한 원인에 대해 사회학자들은 최우선으로 토론 문화의 결여를 꼽는다. 또한 우리나라의 토론 문화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이유는 유교 문화, 역사적 배경, 교육 부재에 기인한다고 한다. 특히 과거 권위주의 시대를 겪으면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주장하기 어려웠고, 민주화된 지금도 토론 훈련이나 리더십 교육이 미흡한 실정이다.
전문가 집단에서는 이런 일반론에 더하여 개개인의 자존심이 토론 문화의 장애 요인이 된다고 한다. 고학력자일수록 상대방의 의견에 타협하기 어려운 자아갈등(ego-conflict)이 많기 때문이다.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많이 지적되듯이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유아독존(唯我獨尊) 생활에 고착되어 집단지성을 위한 토론 문화와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경향이다.
이런 현상이 요즘의 KREI에서도 엿보인다. 하루 종일 ‘방콕’(자기 연구실에 콕 박혀 있음)해도 무사한 근무 환경이 토론 문화를 위축시키고 있는데다, 그런 생활에 익숙해지니까 공식적으로 마련된 세미나나 토론회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전혀 어색하지 않다. 토론 문화가 쇠퇴하여 집단지성이 위축되면 입심 센 몇몇 사람들의 주장이 지배하는 사회가 된다. 이는 정보를 독점한 부족장이 의사결정을 전담하던 봉건시대와 다를 것이 없다. 이런 풍조가 고착되면 결국 개개인이 창의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집단지성을 발휘하기 위한 조건으로 다양성(사람과 정보), 독립성(차별된 지성), 통합성(지성의 통합)이 제시된다. 이런 점에서 KREI는 농림업과 농촌 경제사회 분야의 다양한 연구자가 모여 있으므로 그 어느 조직체보다 훌륭한 집단지성의 기초조건과 역량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집단지성의 산물로 그동안 많은 연구보고서를 생산하면서 바람직한 정책 제언을 통해 국내외적으로 KREI의 위상이 거양되고 있다고 자부한다.
벌써 이립(而立)도 지난 서른세 살에 걸맞게 KREI가 더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우리 모두의 역량을 바탕으로 KREI의 집단지성이 발휘되어 농업과 농촌 및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국책연구기관으로 명성을 떨칠 수 있도록 노력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