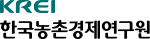

|
[경제활동·일자리] “청장년 농가그룹 영농규모 확대 기회 마련해야”
1270
|
|
|---|---|
|
“청장년 농가그룹 영농규모 확대 기회 마련해야” 2016-07-19 표준 영농규모 2ha 미만인 청장년 농가그룹(S/Y)이 급속히 감소한 가운데 이들의 영농규모를 확대해 청장년 중대농(L/Y) 그룹으로 이동하거나 농외소득을 확대함으로써 1종 겸업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경연 김미복 연구위원 농외소득 확대해 1종 겸업으로 청장년·중규모 이상 농가 전문농가 그룹 안착 뒷받침을 이같은 주장은 1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농가경제 변화-실태진단과 정책과제 토론회’를통해 김미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제시한 것이다. 김연구위원은 발제인 ‘농가 유형별 소득구조 변화와 정책 시사점’에서 “2015년 명목 농가소득은 전년 대비 6.5% 증가한 3721만 원으로 전년에 비해 약 226만원 증가했다”며 “명목 농업소득은 전년 대비 9.3% 증가한 1126만원”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은 농가유형 구분의 경우 “2000년대 들어서 농업의 규모화, 전문화, 겸업화와 함께 농가고령화, 영세농 증가 현상이 심화되고 소득양극화로 평균 농가소득이 정체되는 주요인의 하나”라며 “5ha 이상 대규모 농가가 2000년 1.7%에서 2010년 3.4%로 증가하고, 농외소득이 높은 2종 겸업농이 늘어나는 한편 70세 이상 경영주가 최빈치가 되는 고령화가 계속된다”고 분석했다. 김 위원은 특히 “농업구조변화에 따라 다양한 농가유형이 구분되는 만큼 평균 농가개념으로 정책을 설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연령 및 규모를 고려해 유형을 구분하고 어떤 소득구조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추이를 분석했다”고 밝혔다. 기준은 연령 65세와 표준 영농규모 2ha이다. 이에 따른 농가유형 구분은 고령 소농(S/O), 고령 중대농(L/O), 청장년 소농(S/Y), 청장년 중대농(L/Y) 등 4가지다. 청장년 중대농의 경우 표준 영농규모 2ha 이상, 65세 이하이다. 농가소득은 6980만 원으로 2010년 대비 19.3%(실질 기준 12.1%) 올랐다. 이들의 소득비중이 가장 높은 항목은 농업소득으로 2015년 기준 3660만 원으로 2010년 대비 20.8% 증가해 농가소득 상승에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평균 농가에 비해 농업소득 비중이 높고, 농업소득 증가율 역시 높아 전문농가 비중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위원은 하지만 “이들 그룹에서 소득이 양극화되고 지속가능 이하 농가 역시 절반이 넘는다는 것은 청장년, 중규모 이상 농가가 안정적으로 전문농가 그룹에 안착할 수 있는 투자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령 소농은 영농규모 2ha 미만, 65세 이상으로 농가 인구의 45.5%이다. 소득은 이전소득 상승으로 2010년 대비 11.8%(실질기준 5%) 올랐다. 75세 미만 은퇴 이전 농가는 소규모 영농에 대한 안정적 판로를 확보해 농업소득을 유지하거나 농가의 소규모 사업소득인 겸업소득 및 단기근로 등 사업 이외 소득이 포함된 농외소득을 확대하는 것이 소득유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 다음은 청장년 소농으로 2010년 32.5%에서 지난해 21.5%로 크게 감소했다. 1~3ha 구간 농가 수가 감소하고 양극화가 확대됐다는 분석이다. 이들은 2종 겸업농가가 57.2%로 2010년에 비해 10% 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2종 겸업농가는 겸업농가 중 농업총수입이 농업 이외 수입보다 적은 농가이다. 김 위원은 “이들은 현재 영농기반이 취약해 소득이 낮은 젊은 소규모 전업농가의 경우 영농규모를 확대해 청장년 중대농 그룹으로 이동하거나 농외소득을 확대해 1종 겸업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고령 중대농은 주로 논벼 농가로 전체 농가 비중이 17.4%인데 2010년 7.8%에서 급증했다. 이들의 농가 소득구조는 농업소득과 농외소득이 14% 감소한 반면 이전소득은 2배 이상 증가해 공적보조금이 50% 이상 늘었다. 김 위원은 “이들 그룹은 농업생산지역 보유 비중이 높은 그룹이어서 조직화 등으로 생산성을 제고해 경영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후계 승계 인력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생산기반을 계속 유지하는 대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국농어민신문 문광운 기자 moonkw@agrinet.co.kr |
|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