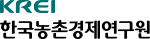| 한국농어민신문 기고 | 2016년 9월 30일 | 김 정 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스무 살 추석 날에 시골집 마당에서 바라본 들판 건너 수암산(水巖山)은 그리 높지 않았었다. 해발 300미터도 안 되는 앞동산이 높다고 생각했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혼자 웃었다. 다시, 스물 몇 해가 지나 이번 추석에는 그 산도 늙은 듯했다. 산이 늙은 건 마을 사람들이 늙은 탓이다. 혹은, 죽었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우리 동네 변한 모습을 떠올려본다. 마을과 함께 늙은 수암산이 지켜보았을 내력을 짚어본다.
1970년대 말 동네 잔칫집을 누비며 국수를 얻어먹고 약과며 떡이며 사탕 따위를 주머니에 한껏 쑤셔넣던 꼬마들, 긴 겨울밤 십원 짜리 빨래비누 내기 윷놀이 판을 벌인 할머니들 틈에서 조청 얻어먹는 재미로 말판에 말을 놓던 잔챙이들, 프로 레슬러 김일의 시합을 구경하겠다며 흑백 텔레비전 있는 집에 몰려 다니던 코흘리개들은 이제 어른이 되어 외지에 산다. 스마트폰 게임에 열중하는 제 자식을 자동차 뒷자리에 태우고 명절을 쇠러 내려온다. 언제까지나 수줍은 미소로 맞아줄 것 같았던 길 옆 코스모스와 치렁치렁한 버드나무는 사라졌다. 신작로에 아스팔트 덮이면서 없어진 지 오래다. 시골 풍경을 이루던 사물들은 하나둘씩 자취를 감추었다.
시골풍경 이룬 사물들 사라지고
1990년대 중반 외조부님 칠순 잔치였다. 동네 사람들 불러 음식과 술을 나누었다. 해질 무렵 흥이 무르익었다. 마을분들 몇이 오랜만에 꽹과리, 징, 장구, 북 등을 꺼내어 치기 시작했다. 오래 가지는 않았다. 서울에서 내려온 이모, 삼촌 등이 말렸던 탓이다. 밤에 시끄럽게 소리를 내면 이웃들이 불평한다는 이유였다. 동네 창고 깊숙이 두었던 악기들은 그 후로 몇 차례 해마다 한 번은 백중날에 햇볕을 볼 일이 있었으나, 그게 끝이었다. 그 무렵 마을 사람들끼리 이루어지던 품앗이도 사라졌다. 2007년 추석에는 마을 대동회가 열렸던 이야기를 들었다. 사람들이 오래 산다고 해서 장명동(長命洞)이라 불렀다는 고향 마을에서 해마다 열 분 넘게 세상을 떠나셨다. 그때까지는 마을에 남은 젊은 사람 한두 명이 다른 마을에서 사람을 데려와 상여를 내가면서 초상을 치렀다. 그런데 정작 본인의 농사일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두 손을 다 들었다는 것이다. 결국, 마을 공동 재산인 꽃상여에 시신을 모시고 산소자리까지 가던 오랜 전통을 포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들었다. 앞으로는 납골당에 모시든지 외지에서 사람을 사서 장례를 치르든지 각자 집안에서 알아서 하기로... 어린 시절 귀신 나온다고 피해 다녔던 상여집은 그렇게 없어졌다.
고령화 된 농촌, 빈곤 겹쳐 더 암울
재작년 설에는 시골 집 달력이 바뀐 것을 보았다. 농촌에는 집집마다 안방 벽 잘 보이는 곳에 큼지막한 달력이 걸려 있다. 날짜를 크게 인쇄하고, 그 밑에는 ‘십간십이지(十干十二支)’로 해당되는 날을 표기한 달력이다. 갑오(甲午), 을미(乙未), 병신(丙申), … 하는 식이다. 그림으로 쥐, 소, 호랑이, 토끼 등 십이지신 형상을 함께 표시해 놓은 것도 가끔 볼 수 있다. 아직도 그렇게 ‘구식’으로 장 담그기에 좋은 날짜나 제삿날을 헤아리는 어르신이 많은 탓이다. 내 눈길을 잡아 끌 정도로 달라진 것은 달력 자체가 아니라 달력을 제공한 곳이다. 열두 장 달력 종이마다 하단에 큰 글씨로 인쇄되어 있던 ○○농협 또는 ××신협이라는 단어가 사라졌다. 대신 ‘△△실버노인요양센터’라는 글자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 연세 아흔을 넘기신 외조부님을 돌봐드리는 요양보호사가 매주 두어 번 오는데, 요양보호사를 파견하는 업체가 동네에 달력을 배포한 게 틀림없다. 도시에서나 시골에서나 연말에 달력을 돌리는 이는 무엇인가를 ‘판매’해야 하는 업체고 달력을 공짜로 얻는 이는 바로 그 고객들이다. 노인들로, 그것도 거동마저 불편한 노인들로 그득한 시골 마을에서 마케팅 활동이 활발했던 것이다. 이 무렵 마을 노인회에는 갈등이 있었다. 칠순을 한참 넘긴 ‘늙은 노인’과 그 아래인 ‘젊은 노인’ 사이에 뭔가 뜻이 안 맞았던 게다. 그러고 보니 노인회 갈등이 아니라 마을 갈등인 셈이다. 노인회 회원이 아닌 사람은 서너명 손에 꼽을 정도니까. 이번 추석에도 요양보호사 이야기가 나왔다. 얼마 전에는 일주일 넘게 오시질 않았다고 한다. 나중에 보니 이웃 면에 아로니아 농사 짓는 집에 가서 품삯 받고 일 하느라 그랬다고 한다. 아로니아 수확작업 일당이 짭짤하기 때문이란다. 그렇게 돈 되는 일이라면 열심히 쫓아다니는 요양보호사도 알고 보니 환갑을 넘기신 분이다.
엊그제 다녀온 어느 농촌의 주민들은, 다들 60세를 넘긴 노인인데, 이런저런 일거리를 찾아다니는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인근 골프장에서 골프공을 주워 파는 일, 지역에 여럿 있는 리조트에서 일당 받고 하는 허드렛일, 읍내 식당일, 가을에 잣 주워 파는 일, 농번기의 일용 농업노동, 겨울철 벌목 현장에서 나무 베는 일 등등 종류도 많았다. 점점 나이가 드는 데도 그렇게 일거리를 찾아 다니는 연유를 물었다. 하나 같이 공통된 대답이 둘 있다. “농사만 지어서는 먹고살기 힘드니까.” “손주들 오면 용돈이라도 줘야지.” 어느 분이 말씀하신다. “연금을 들어 놓은 게 있다면 좀 나았을 텐데.” 또 다른 분이 덧붙인다. 옆 동네에서는 노인들이 공동으로 시래기를 말려 판매하는데, 군청의 도움이 적지 않았다고.
우리사회가 그분들께 진 빚 기억을
농촌 지역사회에 노인만 남았다고 하지만, 빈곤과 겹친 그 고령화의 실상은 세간의 짐작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 정부가 한달에 최대 20만원까지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의 비율이 농촌에서는 열에 일곱, 여덟은 된다고 한다. 자식보다 낫다는 말도 들린다. 그러나 고령 농민 대부분에게 기초연금 같은 공적 부조가 충분한 소득은 되지 못한다.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노후를 버틸 만큼은 되지 못한다. 체력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아니 한계를 초과하여 농사일이든 다른 일이든 찾아 나서는 어르신이 적지 않다. 거동하기 어려울 정도로 노쇠한 어느 어르신이 불충분한 돌봄 서비스에 의지하다가 요양원에 들어가거나 자식 집으로 옮겨 갔다는 말은 명절 때마다 듣는 단골 소식이다. “살면 얼마나 더 산다고… 마음이나 편하게 살아야지.”라는 말을 버릇처럼 되풀이하는 시골 노인들, 한국 사회가 그 분들께 진 빚이 적지 않음을 떠올려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