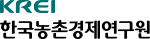|
 | KREI 논단 | 2015년 5월 12일 | 김 정 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전체 농가 중에서, 농업 종사자 수가 1명인 농가의 비율이 1991년에는 10.8%였는데 2014년에는 25.9%가 되었다. 앞으로도 한동안 그 비율은 계속해서 높아질 것이다. 누구나 다 알듯이 농가 인구 감소 및 고령화의 당연한 결과다. 농업 종사자 수가 1명에 불과한 농가의 상당수는 노인 독거 가구일 테다. 농업 종사자 수가 1명뿐인 농가는 요즘 늘어나는 귀농 가구들 사이에도 흔하다. 농가 평균 상시 농업 종사자 수는 2003년에 3.2명이었던 것이 2012년에는 1.8명으로 줄었다. 농외소득이 농업소득보다 큰 2종 겸업농가 비율은 2003년에 18.6%였던 것이 2013년에는 31.9%로 급격히 증가했다.
‘가족을 단위로 농업경영을 영위하는 동시에 필요로 하는 노동력의 대부분을 공급하는 경영’이라고 정의(定義)하든, ‘농경을 주업으로 하여 독립 생계를 영위하는 단위’라고 하든 가족농이라는 생활양식이 크게 약화되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래도 가족 농업 노동이 우리나라 전체 농업 노동의 80%를 차지한다. 어쨌든 농사의 대부분은 가족이 짓는다. 그럼에도 가족농은 정책 담론의 수면(水面) 위로 좀처럼 떠오르지 않는다. 지난해는 유엔총회가 지정한 ‘세계 가족농의 해’였다. 변변한 논의조차 없이 지나보냈다는 철 지난 반성과는 무관하게, 가족농의 현실은 팍팍하기만 하다. 20년 전에는 농가 겸업을 탈농의 징후로 간주하기도 했는데, 요즘에는 ‘농사지으면서 시골에 계속 살려고 가족 가운데 누군가는 농사가 아닌 다른 일을 하는’ 기이한 겸업을 자주 보게 된다. 세간에서는 ‘농민’보다 ‘농업인’이, ‘농가’보다 ‘농업 경영체’라는 표현이 점점 더 잦은 빈도로 사용된다. 마침내 ‘농민 가족이 농사짓는다’는 관념조차 생경하게 되어, 지금 우리가 ‘머슴’이라는 말을 떠올리듯 ‘가족농’이라는 말을 추억할 날이 오려는가? 30여 년 전 브라운관 텔레비전 앞에 둘러 앉아 감정이입하면서 보았던 외화(外畵) “초원의 집” 따위를 향수하는 낭만적 근심을 토로하려는 게 아니다.
유엔이 ‘세계 가족농의 해’를 지정했던 것은 소규모 가족농이 유지·재생산되어야 할 필요성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흔히 말하는 빈곤 완화, 먹거리 보장(food security), 자연자원 보호, 농촌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등으로 회자되는 역할들이다. ‘산업으로서의 농업’과 ‘생활양식으로서의 가족농’은 여러 측면에서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고 다른 결과를 낳는다. 산업적 농업이 자연을 전유(專有)한다면, 가족농 생활양식은 자연과 공생하거나 자연을 보살핀다. 산업적 농업이 단작-집중에서 효율을 얻는다면, 가족농 생활양식은 다양성-균형에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 산업적 농업 경영체가 이윤을 극대화하려 하지만, 가족농에게는 생계유지가 가장 중요한 목표다. 산업적 농업 경영체가 시장 교환양식에 전적으로 의존하지만, 가족농은 시장으로부터 독립하지는 못해도 나름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시장과의 거리두기’에 신경 쓴다. 산업적 농업의 효율성을 추구하다보면 농사짓는 사람 수는 줄어야겠지만, 가족농 생활양식이 온전히 유지된다면 고용 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산업적 농업은 농부를 노동력으로 보고 그 수를 계산하지만, 정작 가족농의 농부는 스스로를 장인이라고 혹은 예술가라고 생각한다. 산업적 농업은 흑자/적자 혹은 성공/실패의 이분법적 논리 구조 위에서 평가되지만, 가족농은 균형있게 유지되는가 혹은 공생하는가라는 물음 앞에서 평가된다.
‘세상의 모든 것을 성공과 실패로 나누고, 삶의 끝 순간까지 숨 가쁘게 사는 그런 삶은 싫어’라던 노랫말을 기억한다. ‘모든 글은 과장(誇張)’이라지만 성장과 정체, 진보와 퇴보, 성공과 실패라는 식의 대조는 과장법 중의 과장법이다. 써먹을수록 식상하다. 게다가, ‘균형’의 문제를 은폐하는 풍경이 된다. ‘모 아니면 도’라고 하지만, 윷놀이 판에는 개, 걸, 윷도 함께 있는 법이다. 한 번에 다섯 칸을 건너뛰는 모(농업법인)도 아니고, 엉금엉금 기는 것 같지만 그래서 눈에 띄는 도(농업 노동자)도 아닌 가족농은 어떤 존재인가? 웬델 베리(W. Berry)의 말대로, “가족농으로 농사를 지으며 사는 농민에게는 정년 보장도, 업무시간도, 자유로운 주말도, 유급휴가도, 안식년도, 퇴직금도 없다. 직업적인 위신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농사짓고 살려고 일상생활과 농사일의 모든 부분에서 투쟁하는 그이들은 누구인가? 우리는 그이들을 이해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던가? 가족농을 농정의 잔여적·주변적 대상으로만 간주하는 한, 근본적인 변화는 난망(難望)이리라. 가족농, 여기가 출발점이다.
|